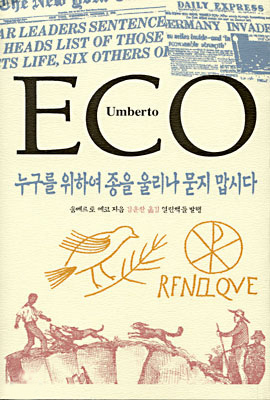
쟈크 엘룰의 '뒤틀려진 기독교'를 읽었을 때 느꼈던 거대한 기독교 전통의 그림자를 '장미의 이름'에서도 느꼈고, 이 에코의 작품을 읽을 때도 느끼게 되었다. 또 유럽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끌어가는 첨단을 읽었다는 느낌도 든다. 이 책은 시사 문제에 대해서 지식인의 윤리적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는 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책이다.
에코가 짧게 언급하는 주제는 '전쟁' '파시즘' '신문' '타자(他子)' '이주, 관용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주제가 언뜻 보기에는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읽다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읽힌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쟁'에서는 세계대전 전후와 걸프전까지 이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짚어내는 지식인의 역할을 말하고 있고, '파시즘'에서는 복잡다단한 파시즘을 자신의 유년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통찰하고 있고, '신문'에서는 신문으로 대표되는 미디어를 비판하고 있으며, '타자가 등장할 때'에서는 '타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새 계명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힘겹게 인정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용'부분에서는 아우슈비츠나 마녀사냥과 같은 엄청난 비극이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타인을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며, 관용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모든 비극의 동조자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 책이 깨닫게 하는 것은 첫째, 목회자가 시사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을 말하려면 자기 비판과 보다 나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종교와 윤리 사이의 갈등을 너무 쉽게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자제하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지금의 기독교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상적인 스펙트럼이 존재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시사에 대한 민감한 도덕성 시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